혈액형으로 성격을 판단하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1971년 일본 작가 노오미 마사히코의 《혈액형 인간학》에서 시작된 이 이론. 인간을 단 4가지 유형으로?
물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요즘 핫한 MBTI는 어떨까요?
캐서린 쿡 브릭스와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만든 이 검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부족한 노동력때문에 빠르게 적합한 직무를 찾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홈스쿨링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딸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참고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이 검사를 만들었을 당시 전문 심리학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도 실제로 MBTI는 교육 및 심리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MBTI 테스트 문제점
첫째, 검사 신뢰도가 낮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시기에 검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 검사의 표준인 BIG 5 이론과 비교하면 신뢰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둘째, 과학적 타당성 부족. 16가지 유형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인간 성격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했고,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셋째, 성격의 변화를 무시합니다. MBTI는 성격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성격은 경험과 환경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MBTI, 재밌게 즐기는 건 좋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혈액형 성격론처럼, MBTI도 유과학에 가깝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런 분류에 끌릴까요? 복잡한 나와 타인을 간단히 설명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건 16개 유형이 아니라, 눈앞의 ‘이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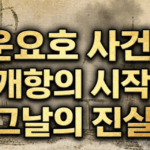

![[최신 자료] 국가유공자 치매혜택 완벽 가이드, 진료비 지원부터 요양병원까지](https://meaade.com/wp-content/uploads/2026/02/최신-자료-국가유공자-치매혜택-완벽-가이드-진료비-지원부터-요양병원까지-150x150-optimized.png)


